<빌헬름 텔 인 마닐라>의 저자 아네테 훅 작가님게서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서울국제작가축제…‘디아스포라’ 주제 작가 대담
난민 수용 주저하는 한국, 단일민족이란 교육이 ‘덫’
3년 전 난민은 ‘모험적 주제’…우리사회 가장 큰 난민집단은 같은 동포인 탈북민일 수도

현대에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이민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국제적 이주와 난민의 대량 발생으로 디아스포라는 삶의 한 조건이 되었다.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다.
문학도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이주나 난민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쓰이고 있다. 지난 21~27일 열린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도 디아스포라는 주요한 주제였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문고 더숲에서 시인 심보선·오은, 소설가 표명희·박솔뫼, 스위스 소설가 아네테 훅과 조지아 시인 니노 사드고벨라슈빌리가 참석한 작가들의 수다 ‘우리가 떠돌며 서 있는 곳-디아스포라’가 열렸다.
“디아스포라는 자신이 속했던 곳에서 벗어나 흩어져 사는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속된 곳을 벗어나 사는 삶의 양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사태를 관찰하고 묘사하기에 디아스포라와 근접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를 맡은 심보선 시인(48)이 말을 열었다. 오은 시인(36)은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디아스포라나 소수자의 문제에 귀 기울이는 게 문학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설가 표명희(53)는 지난 3월 한국 사회의 난민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어느 날 난민>을 펴냈다. 지난 5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으로 ‘난민 찬반 논란’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 직전에 펴낸 ‘예고편’과 같은 소설이다. 표명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었는데 소설을 쓸 땐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경험도 없다. 난민이란 용어가 알려진 것도 최근 몇 개월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는 이민자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교육한다.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도 적고, 국민 여론이 난민에 대해 좋지 않아 정부도 난민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명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출품한 단편소설 ‘동조선 이야기’에서는 재일조선인 이야기를 다뤘다. “아버지는 대단한 착각을 했던 거지. 조선인 2세가 화이트칼라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 주인공의 재일조선인 사촌은 ‘부친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며 택시 운전사가 된다. 소설에서 일본이 한국과 같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란 면에서 ‘동조선’이라고 일컫는데, 한국 또한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이란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 리(44)는 3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와 현재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리는 “이주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불편한 마음을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고 거추장스러웠다. 내 친구처럼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는 “작가가 되면서 나는 몸뚱어리가 아니게 됐고, 국경과 국적도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리는 출품한 단편 ‘마을’에서 남미의 한 마을에 들어온 금발 여자가 배척당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리는 “실제 콜롬비아에 여행을 가 금발의 소외된 여성을 만났다. 이 사람도 외부인이고, 조건부로 수락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리는 이민자와 탈북자 등을 다룬 작품을 써왔다. 리는 “난민을 이야기할 때 간과해선 안되는 집단이 탈북자다. 같은 동포이고 피부색도 같지만 남북한 언어가 달라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질성을 경험한다. 탈북자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난민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위스 소설가 아네테 훅(48)은 장편소설 <빌헬름 텔 인 마닐라>로 스위스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살이 독일로 유학와 실러의 <빌헬름 텔>을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 번역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은 식민지배와 이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훅은 “리살이 베를린 학회에 초청돼 정치학자를 만나는데, 정치학자는 ‘두개골 치수를 재도 되냐’고 묻는다. 인종 간 차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며 “유럽인이 다른 대륙 출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라고 생각한다. 유럽인은 타 민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외국에서 ‘타자’로 겪었던 일을 공유했다. 심보선 시인은 “뉴욕 유학 중 길을 가다 ‘차이니스 애스홀(Chinese asshole)’이란 욕설을 들었다. 반사적으로 ‘차이니스가 아니라 코리안’이라고 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애스홀이 아니다’라고 외쳐야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민족적 정체성이 학습되고 습득된 채로 일상을 살아간다”며 “글을 쓸 때는 나를 재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본능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네테 훅은 필리핀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길에 서 있다가 ‘지아이조(G I Joe·미군 남성 병사)’라는 말을 들은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나를 미국 남자로 본 것에 발끈해 ‘난 유러피언이고 여자’라고 말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스위스 출신 젊은 여성의 경험은 난민이나 피란민의 경험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훅은 “유럽은 심리적으로 침체된 상태인데, 한국은 최근 민주주의를 다시 정착시키는 등 긍정적 기운이 느껴지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산지니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언론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간] 바싹 마른 북극곰 살리는 방법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 2℃' 출간 (0) | 2018.11.08 |
|---|---|
| [잠깐 읽기] '우리' 라는 가치의 소중함 (0) | 2018.11.02 |
| [새 책] 마니석, 고요한 울림(페마체덴 지음) (0) | 2018.10.29 |
| [새책]빌헬름 텔 인 마닐라 (0) | 2018.10.29 |
| [새 책] 마니석, 고요한 울림 (0) | 2018.1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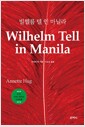





댓글